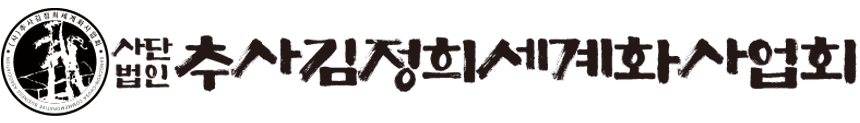추사, 명호처럼 살다
페이지 정보

본문
신간 소개
김정희의 호는 몇 개일까? 343개
추사만의 독특한 세상과 소통 수단
해박함 보여주는 후미운에도 주목
도립전라남도옥과미술관 최준호 관장
추사 김정희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삶의 궤적에 관한 책이 발간돼 화제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금석학자·고증학자이며 실학자이자 화가, 서예가인 추사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담긴 ‘추사, 명호처럼 살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립 옥과미술관 최준호 관장이 추사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명호(名號·사람이나 사물에게 주어지는 성명과 별호 등을 포함한 모든 칭호)를 분석한 연구서를 출간한 것이다. 그가 김정희의 명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8년의 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때문이었다.
‘김정희 새 낙관 53개 햇빛, 183방 집대성.. 완당인보(阮堂印譜)발견’. 당시 대만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최 관장은 ‘추사는 호가 참 많았구나. 대체 몇 개나 될까?’ 생각하면서 유학을 떠났단다. 그 후 다시 추사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5년. 이때부터 추사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추사의 인장 연구서를 준비하다 ‘명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옆길로 빠진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최 관장은 김정희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각종 명호 343개를 모두 찾아 명호, 한글 명호, 도형화된 문자부호 명호 등 1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추사가 일생에 걸쳐 쓴 문서와 편지, 인장(印章), 탁본 등에 서명한 명호와 말미구를 연구했다.
김정희는 1809년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중국 연경에 가기 바로 전에 명호를 ‘추사(秋史)’로 바꿨다고 한다. 바로 이전에는 ‘검고 깊으며 심오한 난초’란 뜻의 ‘현란(玄蘭)’이었다. 중국행을 앞둔 김정희에게 ‘추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상징하는 명호라 할 수 있다. ‘추’는 ‘추상같다’ ‘오행(五行) 중 금(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에는 ‘사관’ ‘서화가’ 등의 뜻이 있다. 최 관장은 이를 종합해 ‘추상같이 엄정한 금석서화가’로 정의했다.
“‘추사’는 바로 파란만장한 김정희의 일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최 관장은 말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벼슬길에 올라 금석학자로 반열에 올랐으나 말년에는 쓸쓸한 귀양살이를 한 김정희의 일생이 어쩌면 ‘추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듯 하다고 풀이했다.
최 관장은 ‘추사’ 외에도 김정희는 ‘보담재’나 ‘완당(阮堂)’은 중국 스승 옹방강과 완원 등을 존경해 붙인 것이며, ‘동해’ ‘천동’ ‘계림’ 등 조선인으로 자부심을 나타낸 것도 있다고 적고 있다. 귀양을 갔다가 낙향해 한강에서 농어를 잡고 세월을 보낼 때는 ‘국수를 먹는다’는 뜻의 ‘담면’(噉麵)을 써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과천에 살 때는 ‘병든 과천 사람(病果)’를 사용했으며 30세에 만난 동갑내기 초의선사(草衣禪師)와 깊은 교유를 나누면서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완당 노인’ 외에 ‘뎡희’, 때로는 ‘보담 주인’이라고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이름을 줄여 정희 또는 정만 쓰기도 하고 다른 단어와 결합해 제정희, 죄인정희, 증손정희 등의 명호도 보인다.
최 관장은 김정희에게 이처럼 많은 명호를 사용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 관장은 설명했다. 정치 상황과 자신의 처지, 건강, 편지를 받을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명호를 다르게 썼다는 것. 결국, 추사만의 독특한 소통 수단으로 343개라는 많은 명호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 최 관장의 연구 결과이다.
또한 최 관장은 김정희의 명호뿐만 아니라 편지나 글 마지막에 있는 후미운에도 주목했다. 편지를 쓴 뒤 마무리를 위해 때와 장소, 부탁말, 독백 등을 담은 글을 쓰는 후미운(後尾韻:글 말미를 장식하는 운. 최 관장이 만든 용어)은 김정희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과 함께 금석학 분야에서의 해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최 관장은 말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륵’이다. 중국 <강희자전>에 ‘륵’은 ‘돌이 (비바람에 의해) 결에 따라 갈라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어대사전>에는 ‘금석에 문자를 새김’ ‘글을 쓰다’는 의미로 발전했는데, 김정희는 ‘륵’을 ‘글월을 쓰다’ 또는 ‘돌에 힘들여 새기듯이 글월을 쓰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 제주도 귀양살이가 한참 지날 때부터 유난히 많이 쓴 걸로 보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진다.
최 관장은 “김정희는 명호와 후미운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상대를 교육하는가 하면 세상을 조롱하기도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심정 등을 그 속에 포함해 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최 관장은 이번 책을 펴면서 세운 목표는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김정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서적이 되었으면 하는 것과 김정희에 대한 게놈지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대한 철저히 고증에 의해 추사의 작품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록했다고 한다.
홍익대 동양화과를 나와 국립대만사범대학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각학을 전공한 최 관장은 추사 관련 책을 하나 더 준비 중에 있다. 벌써부터 그 연구서가 기다려진다.
양광석·방수진 기자gnp@goodnewspeople.com 2013. 01.08. 15:38
- 다음글추사 행적도 23.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